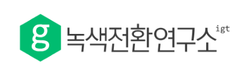정부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하며 하한선 50~53%, 상한선 60%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기후과학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래는 이에 대한 녹색전환연구소의 공식 논평이다.
하한선 50-53%?
기후과학·헌재 결정·국제기준 무시한 2035 NDC안은 목표가 아니다
정부가 11월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이하 2035 NDC안)을 2018년 대비 ▲50~60% ▲53~60%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후헌법소원 결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제시한 과학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가 '하한선'에 있다. 부처간 협의에서 상한인 60%에는 모두 동의하나, 하한을 50%로 할 것인지 또는 53%로 할 것인지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다시 한 번 '속도조절론'에 넘어간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누구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기후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가 결코 아니다.
지난해 8월 헌재는 "정부가 단기 이익에 치우쳐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나, 하한선이 50%나 53%로 정리될 경우 이는 헌재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2025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5)'에도 여러 지적이 담겨 있다. UNEP은 한국의 NDC와 기후정책을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명확한 궤도가 부재한 국가로 평가했다. 산업 부문 NDC 세부 경로가 불명확할뿐더러, CCUS·수소 등 기술적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
UNEP은 한국이 기술력과 재정 능력에 비해 감축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30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정책의 급가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국가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1.5°C 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035 NDC안은 10년 전 국제사회가 약속한 1.5℃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수치는 분명하다. 1.5℃ 기후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선 2035 NDC는 최소 61% 이상으로 설정돼야 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안된 '한국형 전환금융(K-GX)' 도입 역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사례를 언급하며 K-GX 도입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기술별·산업별 실제 감축효과를 수치로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탄소고착화', 즉 다배출 산업의 탄소집약적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국제 주요 시장의 비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못할 경우 K-GX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돕는 정책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됐으나, 정책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하고, 장기적 전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후정책의 방향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재를 보여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헌정적 책무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축목표 수립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